

한 임신부의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A씨의 산통이 길어졌다. 아기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진공기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기로 했다. ‘흡인분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아기의 뇌가 심각하게 손상됐다. 아기는 두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A씨는 출산 5개월 전 배 속의 아기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사의 태아보험에 가입했다. 사고 후 A씨는 약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의 태도가 바뀌었다. 보험사는 ‘태아는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된다’고 약관에 규정돼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또 기존에 지급한 보험금 1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보험사 “태아는 피보험자 될 수 없어”
재판에서 보험사는 “태아는 어머니의 몸에서 완전히 나온 순간을 기준으로 사람으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며 태아는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흡입분만에 동의한 것도 문제 삼았다. A씨가 흡입분만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1,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해보험 피보험자는 단순히 보험의 대상자일 뿐, 사람으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태아도 보험 가입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보험사 스스로 보험계약서 피보험자란에 ‘태아’라고 기재한 점도 짚었다. 게다가 A씨에게 보험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다.
‘우연한 사고’가 맞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 등 보호자가 (흡입)분만을 위한 의료적 처치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흡입 분만 과정에서 뇌 손상 등의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영구적인 시각장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 “태아도 사람... 보험보호의 대상”
보험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면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연구원은 ‘태아보험’이라는 명칭 자체가 혼선을 빚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명칭 때문에 ‘태아’ 상태에서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 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보장 시점을 출생 이후로 하는 상품의 경우 태아보험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어린이보험 또는 다른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혼란이나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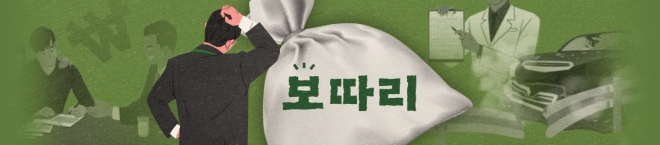

강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