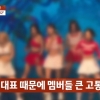랜던 도노번(미국) vs 웨인 루니(잉글랜드)
17세 때 주급 80파운드(14만 5000원)를 받은 ‘축구 종가’ 잉글랜드 골게터. 그리고 6세 때 유스팀 첫판에서 7골을 터뜨린 시들지 않은 ‘다크호스’ 미국의 골게터가 정면 충돌한다. 웨인 루니(25·잉글랜드)와 랜던 도노번(27·미국)이다. 무대는 6월1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C조. 조별리그 첫 판이다.

승부욕이 워낙 강하다 보니 어려서부터 ‘악동’ 별명을 달았다. 그러나 다혈질인 성질만큼이나 들쭉날쭉한 경기력은 대표팀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스스로 만족스럽진 않지만 12일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14골로 선두를 달린다.
에버턴 유스팀에서 뛰다가 2001년 열여섯 나이에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이어 10월 아스널과의 경기에선 골을 신고해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리그 최연소 득점이자 아스널의 30경기 무패기록을 깬 쾌거였다. 유로 2004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 몸값은 치솟았고, 그해 당시로선 만만찮은 이적료 2700만파운드(488억 1880억원)를 기록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옮겼다. 2005~06시즌 발등 골절로 중상을 입은 뒤 태클 공포증을 앓기도 했다.


미국 하면 프로야구(MLB)를 떠올리지 프로축구(MLS)를 떠올리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독일 월드컵을 앞둔 2006년 4월 FIFA 랭킹 4위에 오른 북중미 강국으로 손꼽힌다. 이번 월드컵 엔트리 23명 가운데서도 플레이메이커 랜던 도노번은 단연 눈에 띈다.
루니를 ‘호랑이’에 견준다면 그는 ‘여우’로 통한다. 루니처럼 일찌감치 신동으로 불리다가 대들보로 자리를 잡았다. 21세의 나이에 처음 출전했던 2002한·일 월드컵 때 신인상을 받았다. 축구가 큰 인기를 얻지 못한 미국 출신이라는 게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 정도다. 역시 큰 체격은 아니지만 중앙 미드필더와 윙어는 물론 처진 스트라이커까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서 다양한 전술에 맞춤형이라는 점은 루니와 닮았다.
플레이 스타일은 사뭇 다르다. 빼어난 스피드를 바탕으로 치고 들어가 한 방을 해결하거나 재치 넘치는 송곳 패스를 찔러 준다. 2000년 대표팀에 몸담았다.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프로 첫 발을 뗀 이후 MLS를 거쳐 올해부터는 EPL 에버턴으로 옮겨 톱클래스 선수들과 겨루고 있다. LA갤럭시에서 경기당 평균 0.6골을 뽑은 그는 미국 공격의 시발점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1-13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