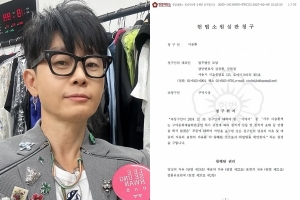백악관 對사이버테러 총지휘 정부 보안예산 年 100억弗
미국 정부는 해킹이 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행위라는 생각을 굳혔다. 백악관은 지난달 미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이 해킹 피해를 당한 직후 사이버보안 방안을 논의한 결과 군사적 대응 방침을 정했으며, 해킹을 ‘전쟁행위’로 명시한 보고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해킹이 진주만 공습이나 9·11테러처럼 기습적으로 허를 찌를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사실 미국이 해킹 피해에 대해 경각심을 본격적으로 가진 것은 2년여 전부터다. 미 국방부는 2009년 1월 국방보고서에서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NCW)를 미군의 핵심역량으로 규정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네트워크 보안문제를 총괄하고 미래의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백악관에 국가 사이버 보안조정관을 뒀다. 사이버 보안 조정관은 사이버 테러 발생시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총지휘관 역할을 수행한다. 그해 5월 미군 전략사령부는 군인 2000~4000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전 특수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다음달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사이버사령부’를 창설, 기존의 사이버 전력의 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사이버사령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사이버사령부는 미군 전략사령부의 지휘 아래 있다. 전략사령부는 모든 정보와 전력을 유기적으로 통합·활용해 전 세계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휘부다. 결국 사이버사령부가 전략사령부에 배속됐다는 것은 미국이 사이버전을 글로벌 전략전술로 다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방부에만 700만대의 컴퓨터가 있고, 1만 5000개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 정부의 네트워크 보안 예산은 연간 100억 달러 또는 전체 정보기술(IT)예산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이버전쟁의 시초 역시 미국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이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에 특수 공작원을 파견, 이라크 방공 시스템에 컴퓨터 바이러스를 탑재한 칩을 심어 방공시스템을 마비시켰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란 핵발전소가 신종 컴퓨터 바이러스 ‘스턱스넷’(stuxnet)에 감염됐을 때도 미국의 사이버 공격설이 유력하게 대두됐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일 미 국방부가 컴퓨터 해킹을 위한 사이버무기(바이러스 포함)들을 승인한 리스트를 만들었으며, 여기에는 스턱스넷 같은 바이러스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6-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