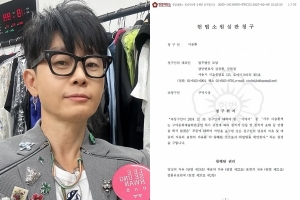김상연 워싱턴 특파원
지난 26일 오후 3시 30분쯤(현지시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나타날 때까지 미국 뉴욕의 JFK공항 입국장은 지극히 평온했다. 북·미 접촉을 위해 4년 4개월 만에 방미하는 김 부상을 기다리는 취재진은 한국 특파원과 일본 기자 등 20여명 정도밖에 안 돼 보였다. ‘그 흔한’ 방송 카메라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김 부상이 등장한 순간 어디에 잠복해 있었는지 모를 수많은 기자들이 굶주린 사자 떼처럼 일제히 김 부상한테 달려들었다. 가족을 마중 나온 양 딴청을 피우던 시민들이 알고 보니 외신 기자들이었고,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모를 수많은 방송 카메라들이 ‘다연발로켓포’처럼 김 부상의 얼굴을 정조준했다.
김 부상은 취재진에 익사할 듯 “이렇게 하면 내가 말을 못 하잖아.”라며 휘청거렸고 공항 보안요원은 “물러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취재진의 성난 질문 공세를 멈출 도리는 없었다.
100여명의 기자가 엉키다 보니 김 부상이 전진할 때 뒷걸음질치면서 엉덩방아를 찧거나 카메라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람도 있었다.
난생 처음 목도하는 광경에 놀란 미국인들이 “세상에!”(Oh My God)라고 내뱉는 탄성이 그 와중에 들렸지만, 기자들은 마치 이 순간을 놓치면 인생이 영원히 끝날 것처럼 필사적으로 김 부상에게 매달렸다. 보다 못한 신선호 주유엔 북한 대사가 거의 폭력 수준으로 거칠게 취재진을 밀어제쳤고, 몇몇 기자들이 나가떨어졌다. 그래도 취재진은 김 부상이 차에 오르는 최후의 순간까지 질문을 퍼부었다.
김 부상을 보내고 가쁜 숨을 정돈하고 난 뒤 갑자기 자괴감 같은 것이 엄습했다. 왜 우리는 서울도 아니고 평양도 아닌 남의 나라에서 몸싸움을 해야 할까. 이런 상념을 하다 가슴팍이 허전한 느낌에 내려다보니 셔츠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carlos@seoul.co.kr
2011-07-2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