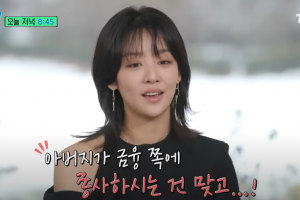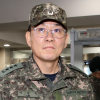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 교수
주택사정은 실로 다양하다. 수도권은 수도권 나름대로, 지방도시는 지방도시 나름대로 제각각이다. 지방도시는 주택이 남아돌아서, 반면에 서울은 주택이 모자라서 문제다. 이처럼 지역 간 주택문제의 불균형은 심각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도시 중에서도 과소 지역이다. 대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은 대도시로의 자본과 노동력, 정책 집중현상을 가져왔고, 농·산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지역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1975년 전국인구 대비 농·산촌 인구 비율은 48.9%였으나, 2010년 현재 농·산촌 인구는 18%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전체 1407개 읍·면 가운데 4000명 미만의 읍·면지역은 882개(62.7%)이며, 2000명 미만의 초소형 읍·면지역도 354개(25.2%)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적 과소화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다. 농·산촌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은 35.3%로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주택 관련 정책은 대부분 도시지역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고, 농·산촌 지역의 정주여건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현실화되면서 농·산촌 정주여건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농·산촌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정주여건 향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목할 것은, 그런데도 이 과소 지역 주민의 정주 의사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강원도 내 과소 지역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2.6%로 조사되어 압도적으로 높은 정주 의사를 보였다. 반면, 노인전용주택이나 시설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은 겨우 0.2%에 불과했고, 도시중심부로의 이주희망자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속적인 정주에 필수적인 지원으로는 통원 등 외출 시의 교통편 서비스가 35.6%로 가장 높았고, 재해 발생 시 피난책이 16.3%, 안부 확인이나 안전 확인이 12.9%, 방문 등에 따른 대화상대 지원이 9.3%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는 이웃주민과의 친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경제적 여건 및 생활형편에 대한 것은 가장 낮은 항목으로 조사됐다.
주택문제와 관련된 우리 모두의 관심사는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의 주택문제가 곧 대한민국의 주택문제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도시 과소 지역의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은 열악해도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은 욕망과 실제 만족도는 대도시보다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정주여건을 둘러싼 과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주택의 개념도 사람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2011-12-1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