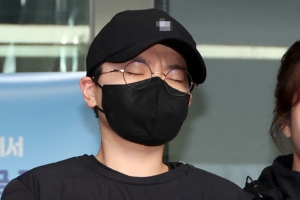이경우 어문부 전문기자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 나는 젊었으니 돌이라 무거울까 / 늙기도 서럽거늘 짐조차 지실까”
노인을 공손히 받들고 돕자면서 ‘늙은이’라고 했다. ‘노인’도, 높여서 ‘어르신’도 아니었다. 그때는 그랬다. ‘늙은이’가 지금처럼 낮추는 말이 아니었다. ‘노인’이 그렇듯이 중립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북한의 ‘늙은이’도 ‘이고 진 저 늙은이’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있다. 북녘에서는 우리와 달리 ‘늙은이’에 ‘낮춤’의 의미가 없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진 말로 사용된다. 북녘은 “늙은이와 젊은이”, 우리는 “노인과 젊은이”라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어르신’은 본래 남의 아버지를 높이는 말이었다. 그렇다 보니 남성 어른을 높여 이를 때 주로 쓰였다. 지금은 구별하지 않고 여성 어른에게도 사용한다. 노인 공경이란 뜻을 표시하는 데 이만한 말이 없다는 듯 확산된다.
지나칠 때가 많다. 공공기관의 ‘독거 어르신’도 그중 하나다. 중립적 표현이어야 더 어울릴 때가 적지 않다. 높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wlee@seoul.co.kr
2018-05-10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