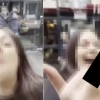2019.3. 고양시. 사람이 뿌려놓은 가루를 먹고 있는 곤줄박이.
곤줄박이는 주변에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텃새로, 야산이나 공원처럼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서식한다. 오랫동안 사람 근처에 살거나 눈에 띄던 새는 비교적 직관적인 이름을 갖기 마련인데 곤줄박이도 그런 새 중 하나다. 곤줄박이의 ‘곤’은 검다는 뜻의 ‘곰’에서 나왔으므로 이름 그대로 해석하면 검은 줄이 박힌 새라는 의미다.
가끔 야산이나 공원에서 나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보면 곤줄박이가 견과를 나무 줄기에 톡톡 두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작은 부리만으로는 나무 열매를 깨 먹기 쉽지 않으므로 작은 발로 딱딱한 열매를 모아 쥐고 부리로 통통 두드려서 열매 안쪽의 내용물이 깨져서 튀어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얼핏 딱따구리가 나무 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
곤줄박이도 사람을 경계하지만 사람에게 과감하게 접근하는 용감한 새이기도 하다. 참새나 박새같은 다른 새들은, 어린왕자의 여우처럼 당신이 매일 세 시에 나타나서 당신의 밀밭색 바지에 익숙해진 게 아니라면 사람 손에 든 먹이는 먹으러 오지 않는다. 그런데 곤줄박이는 처음 보는 사람의 손바닥에 있는 먹이라도 그 사람이 손을 펴고 가만히 있으면 얼른 날아와서 채 간다. 잣이나 땅콩같이 커다랗고 맛과 영양이 풍부한 것이라면 유혹을 참지 못하는 것 같다.
맑고 따뜻한 겨울날, 야생의 새에게 먹이주기 체험을 해 보는 건 어떨까? 가까운 절이나 공원 주변, 삐삐삐삐 쓰쓰?쓰 소리가 들리고 주황색 배의 새들이 분주히 돌아다니는 야트막한 관목 주변에 자리잡고 앉아 맛있는 땅콩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자. 힘들어도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 어느 순간, 곤줄박이의 작고 귀여운 발가락과 발톱이 손바닥에 닿았다가 포르르 날아가는 게 느껴질 것이다. 야생의 새와 접촉하는 그 찰나의 순간! 잊혀졌던 내 야성의 기쁨이 깨어날지도 모른다.
2021-11-2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