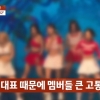김민정 시인
왜 하필 타령이었냐고 누군가 묻기에 일거의 망설임도 없이 그랬다. 가사가 죽이잖아.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 성화를 받치어 무엇 하나. 속상한 일이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니나노. 아아, 사는 게 내내 짜증 더미여서 내가 작년에 ‘태평가’를 즐겨 들었던 게 아닐까 싶었다. 잘도 한다, 옹헤야 그러니까 올해는 잘도 하고 싶어서 ‘옹헤야’를 집었던 게 아닐까 싶었다.
그러고 보니 그 많던 민요 가사책은 다 어디로 사라졌나 문득 그 책자들에 대한 호기심이 이는 것이었다. 기타 치는 동네 오빠네 집에 하도 넘겨 봐서 두툼하게 불어 있던 팝송대백과도, 동아리방마다 책장 간간이 코딱지 같은 게 붙어 있던 민중가요집도 어느 한순간에 애초에 없던 존재들처럼 자취를 감춘 듯했다. 노래지만 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훌훌 읽히던 그 읽음의 순간들을 우린 분명 경험한 게 맞는데 우린 언제 다 잊은 사람이 되었던가.
벽두부터 출판계는 송인이라는 대형 도매상의 부도를 직격탄으로 맞았다. 나 역시 소규모의 한 출판사를 꾸려 가는 일원으로 원치 않은 손해를 감수하게 되었지만 여기서 뻥 저기서 뻥, 크고 작은 피해를 본 출판인들의 사정이 서로 각기 처참하니 우리가 이러려고 책을 만들었나 하는 유행어를 한숨처럼 남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종이책 시장이 현격히 줄어든 마당이라 더이상 책에 날개가 달릴 거라는 꿈도 꾸지 못하는 마당에서 맞닥뜨린 도산이라는 위축은 막막한 우리의 내일을 더욱 깜깜하게 칠해 버리는 검은 손만 같았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간은 줄고, 신간을 기획하는 이도 감감무소식이어야 하고, 신간을 기다리는 독자도 나 몰라라 그런 패턴이어야 하고, 이 모든 책을 팔려는 서점들도 자취를 점점 감춰 가는 게 빤한 계산법일진대 어라, 이게 또 그렇지가 않더란 말이다. 책이 안 팔린다 하면서도 나는 새로 나올 책의 교정지를 겹겹이 쌓아 놓은 채 편집에 바쁘고, 그것도 모자라 책을 새로 하자며 필자들을 따라다니느라 호들갑이고, 그 책 나온다더니 언제 나오냐며 회사로 신간 문의를 해 오는 독자들과 목청 터지게 통화도 하고, 동네 서점 주인들과 소소한 이벤트를 모색하며 커피를 마시느라 속이 쓰리니 대체 한국에서 이 ‘책’이라는 물건을 어떤 조화로 읽어 내야 비교적 온당할지 자꾸만 헷갈리는 것이다.
세상 그 어떤 물건이 돈 앞에서 자유로울까마는 돈의 더러운 속성에서 어쩌면 가장 멀리 던져진 것이 책이리라. 그 외따로운 곳곳에서 배곯는 두려움에도 자기만의 건강한 싹을 자유로이 틔우는 것이 유일하게 책이리라. 사고파는 논리만을 따진다면 이 땅의 무수한 활자들이 과감하게 책의 배내옷을 입고 아이처럼 쏟아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지금껏 책이 존재할 수 있었던 데는 어쩌면 책이 가진 저돌적인 무모함, 책만의 순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다분히 해 보게도 되는 요즘이다.
비록 이 착각이 내 발등을 찍는다 한들 책이니까, 책은 도끼보다 덜 아프니까. 번화한 술집 거리를 통과한 다음날 유독 주머니 속에는 반으로 접힌 전단지가 가득이다. 이 종이 한 장 쓰레기통에 내버리기에도 죄책감이 드는 걸 보니 아직은 나 ‘책 할’ 때인가 보다.
2017-01-2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