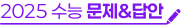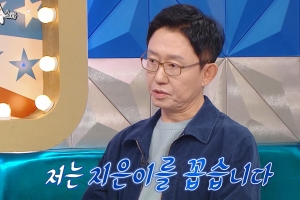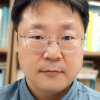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과거 적폐청산의 대상이 돼 민관이 진상조사, 제도 개선까지 노력을 기울였다. 하도 오래 문제가 되다보니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나쁜 것인가보다 하는 게 상식이 돼 버렸는데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거꾸로 자유한국당이 현 정권을 향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며 비판을 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것은 여든 야든 꺼내고 싶지 않은 얘기가 돼 버렸다.
출판계에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특정 저자와 출판사에 대한 지원 여부에 차별을 준 일이 있었다. 담당 공무원 자신이 그 일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그 직원은 해외문화원 근무자라는 이유로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어떤 공무원도 문책 받지 않았다. 과장 위에 국장, 실장 등 관계자들이 있었지만 조사 받지 않았다. 그리고 문체부 수준에서 이 사건은 공식 종료됐다. 셀프 종료다.
관 주도의 우수 및 지원 도서 선정 과정(세종도서사업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일부 사업이다)에서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됐고 그에 따라 그 사업을 민간 이양하겠다고 도종환 장관이 공약했다. 그래서 문체부는 출판계 도서관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 하지만 문체부는 장관의 공약은 공약일 뿐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하더니 지난 연말 태스크포스팀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논의를 끝냈다. 시간은 불의의 편인 모양이다. 어떤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책임은 흐려진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고 있는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문체부가 반복한 말들은 문화행정가들의 의식 수준,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민간은 사업을 공정하게 운영할 능력이 없다며 장관의 민간 이양 공약을 끈질기게 반대했는데, 이런 류의 주장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며 통치 능력을 부정할 때, 혹은 독재정권이 민주주의를 시행하기에는 국민 수준이 시기상조라며 자신들의 통치를 합리화할 때 사용하던 논리였다.
박양우 장관이 새로운 문체부 장관 후보로 지명돼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정식 임명이 된다면 좋은 문화행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 출판과 관련해서는 산업적 관점의 접근을 통해 기여할 많은 일들이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출판계의 블랙리스트 제도 개선 문제가 현안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사소하고, 이미 합의된 일부터 지켜질 때 신뢰가 쌓일 것이고, 그 신뢰가 건설적인 미래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2019-03-25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