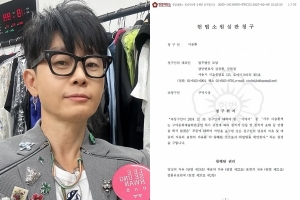청자정은 요즘 배롱나무와의 어울림이 좋다.
청자정이 생긴 것은 2009년으로 그해 11월 1일 제막식을 가졌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박물관인 제실박물관(1909년 11월 1일 개관)을 일반인에게 공개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의 기념물로 지어진 것이다. 청자정은 청자기와와 나무를 기증하고 기꺼이 비용을 댄 여러 마음들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기와가 청자라는 것에 의문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청자로 만든 기와가 맞다.
우리의 문헌에 기록이 남아 있다. ‘고려사’에 “의종 11년(1157년) 봄 4월 고려궁 후원에 연못을 팠다. 거기에 청자를 세우고 이름을 양이정(養怡亭)이라고 했는데, 양이정에 청자기와를 덮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 기록은 고려 궁궐터인 개성의 만월대에서 청자기와가 발견되고 1965년 국립박물관의 전남 강진군 사당리 요지 발굴조사에서 청자기와 파편을 발견하며 사실로 입증됐다. 이를 고증해 만들어 낸 것이 청자정인 것이다.
지금 청자정 근처에는 직경 5m의 동심원 구조로 된 2개의 조각물이 놓여 있다. 이 조각은 한국ㆍ멕시코 수교 60주년 기념 특별전인 ‘아스테카-태양을 움직인 사람들’과 연계한 전시물이다. 작품은 멕시코 작가인 하비에르 마린이 제작한 ‘귀중한 돌, 찰치우이테스’다. ‘찰치우이테스’는 아스테카의 언어인 나우아틀어로 ‘귀중한 돌’, 혹은 ‘물방울’이란 뜻을 갖고 있다. 구조물 안에는 인체의 조각들이 엮여진 채 채워져 있는데, 아스테카인들은 물이나 피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동심원으로 표현했다고 하니 이 작품은 생명과 죽음의 순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며칠 전 점심시간에 청자정을 찾으니 네 명이 그곳에 있었다. 신발을 벗고 올라가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한 사람은 기둥에 기대어 앉아 음악을 듣고 있었고, 외국인 두 명은 박물관 쪽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한 명은 반대편 기둥에 기대어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근처 조각상 앞에선 엄마와 같이 온 아이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전시장에 가지 않은들 어떠랴. 배롱나무에 둘러싸인 청자정과 ‘귀중한 돌, 찰치우이테스’만 즐길 줄 알아도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2022-08-22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