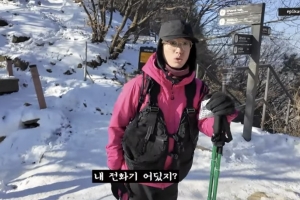이소영 식물세밀화가
그리고 며칠 전 도쿄국립박물관에서 또 다른 소나무를 만났다. 박물관에 온 사람들의 발길이 유난히 오래 머물던 작품은 하세가와 도하쿠의 ‘송림도병풍’이었다. 이 그림 속 소나무는 뿌연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존재한다. 박물관을 걸어 나오며 동북아 국가가 소나무를 통해 공유하는 정서에 대해 생각했다. 지조, 끈기, 절개 같은 것들. 이것은 소나무의 삶에서 비롯된 이미지다.


소나무는 육송이라고도 하며 수피가 붉어 적송이라고도 부른다. 바늘잎에 방울 열매를 만드는 구과 식물 중에서 조경수로 가장 많이 식재되며 변이형질이 다양하다.
논어에서 공자는 “한겨울이 와서 날이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쉬이 시들지 않음을 안다”고 했다. 이 말은 다른 식물이 휴면에 들어가는 겨울에도 푸르른 잎을 내는 소나무의 성격을 뜻하지만, 소나무가 우리 땅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에야 이들을 찾을 우리 미래를 가리키는 듯도 하다.
우리가 소나무를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소나무를 굳이 들여다보지 않는 이유, 소나무를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흔하고 익숙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인간은 늘 새로움에 쉽게 유혹당한다. 소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살아온 역사는 적어도 1만년이 넘고, 현재 우리나라 산림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구과 식물 중 소나무가 도시 조경수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그러니 소나무를 보고 싶으면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소나무에 소홀한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닐까 싶다. 그러나 소나무는 병충해와 산불, 천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점점 살 곳을 잃어 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100년 후 소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것이라 예상한 연구도 있다.


소나무와 비슷하지만 수피가 검은빛인 곰솔. 흑송이라고도 한다. 염분과 바람에 강해 바닷가 근처에 많이 심어 해송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소나무는 한 종이 아니다. 물론 소나무라는 종도 있지만 흔히 가족 이름으로 불린다. 소나무가 여러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소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식물학자 우에키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 분포하는 소나무는 품종과 변종을 합해 40종에 이른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소나무속 식물은 소나무 외에도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눈잣나무 등이 있고 테에다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등이 들어왔다. 이들은 잎의 길이와 개수, 수피의 색, 생육형 등이 다르다.
우리나라 역사는 소나무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소나무로 만든 가구와 기구가 들어 있는 소나무 목재 집에서 살아왔고, 조선시대에는 소나무를 벌목하지 않는 법을 제정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베어졌다. 과거와 현재 우리 곁에서 늘 함께해 온 소나무이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누구도 알 수 없다.
나 역시 이 연재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나서야 소나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다. 내 마음속 소나무도 늘 다른 식물들에게 자리를 먼저 내주었던 것 같다. 올해만큼은 세한의 시간이 지나 봄과 여름 다채로운 풀꽃이 피어나는 순간에도 소나무를 잊지 않으리라 다짐해 본다.
2023-01-2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