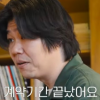이경우 어문부 전문기자
누구도 한글맞춤법을 보고 ‘오빠’라고 적지 않는다. 학교에서 배웠거나 국어사전을 참고했을 것이다. 혹시라도 ‘옵바’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면 국어사전을 찾게 된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는 맞춤법 규정을 뒤적이지 않는다. 단어의 형태를 알려고 규정까지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필요하면 국어사전을 보고 ‘깍두기’인지, ‘깎두기’인지 확인한다. ‘추스르다’는 ‘추스려’가 아니라 ‘추슬러’로 활용된다는 사실도 국어사전을 통해 안다. 띄어쓰기 관련 정보도 국어사전에서 찾는다.
국어사전은 사이시옷을 붙이는 단어들도 친절하게 안내한다. ‘나룻배, 냇가, 냇물, 아랫니, 잇몸…’으로 적으라고 알려 준다. 한데 ‘장맛비, 등굣길, 만홧가게, 북엇국, 막냇동생, 최댓값…’으로 가면 불만이 커지고 목소리가 높아진다. 사이시옷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본래 형태를 일그러뜨린 것에 대한 거부감이다.
사이시옷은 두 단어가 합해져 한 단어가 됐을 때 들어가는데, 규정을 보면 두 개의 단어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고유어여야 한다. 이때 원래 없었던 된소리가 나거나 ‘ㄴ’ 소리가 덧나면 사이시옷을 붙이라고 돼 있다. 국어사전은 성문화된 이 규정을 철저히 따르게 된다. 그러다 보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만다.
그해에 난 콩은 ‘햇콩’이 아니라 ‘해콩’으로 적는 게 규정에 맞는다. 마찬가지로 ‘햇쑥’이나 ‘햇포도’는 ‘해쑥’, ‘해포도’가 바른 표기가 된다. 규정이라는 사실에 놀라는 이들이 적잖다.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한글맞춤법은 국어사전을 만들기 위한 지침 같은 것이었다. 다양한 형태의 표기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확하고 통일된 한글 표기 원칙이 필요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조선어학회는 1947년 ‘조선말큰사전’을 내놓을 수 있었다. 1989년에는 개정된 맞춤법에 따라 국가가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찬했다. 여기에 맞춤법이 다 들어 있다.
맞춤법에 맞추기 위해 한글맞춤법 규정을 찾는 일은 거의 없다. 전문가들과 사전, 출판과 관계된 이들이 주로 찾는다. 내부 규정처럼 됐다. 이런 용도면 족해 보인다.
2020-03-23 27면



























![전쟁·기후변화… 공멸해 가는 인류 깨우다[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