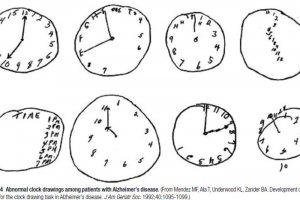무더운 주말 8시간 장거리 산행을 두 달여 만에 하면서 땀을 많이 흘렸다. 입은 옷은 물론 배낭 안까지 축축이 젖었다. 땀의 양도 문제였지만 냄새가 너무 지독했다. 몸 안에서 나온 냄새가 이렇게 심할 수 있을까. 처음 겪어본다. 난감하다. 씻을 곳도 없어 그대로 귀갓길에 올랐다.
버스는 맨 뒤칸 구석에 앉았다. 다른 손님이 옆에 앉을까 조마조마했다. 지하철로 갈아타서는 자리가 있어도 아예 구석에 서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식구들이 코를 틀어막는다. “잦은 음주로 노폐물이 두 달여 계속 쌓였기 때문인 것 같다.”고 변명하고는 서둘러 욕실로 향했다.
땀도 땀 나름이다. 냄새가 다르다. 어릴 적 일을 마치신 어머니 등에 업혀 맡은 땀냄새는 향긋했다. 주중에 절제한 뒤 주말등산 때 흘린 땀은 냄새가 거의 안 난다. 술을 마시고 주말에 흘린 땀냄새는 역겹다. 무절제한 생활을 거듭한 뒤 장거리산행 때 난 땀은 체내의 노폐물이 많이 나와 지독하다. 노폐물을 쌓이게 하는 술마시기를 자제해야겠다. 땀의 경고가 무섭다.
이춘규 논설위원 taein@seoul.co.kr
버스는 맨 뒤칸 구석에 앉았다. 다른 손님이 옆에 앉을까 조마조마했다. 지하철로 갈아타서는 자리가 있어도 아예 구석에 서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식구들이 코를 틀어막는다. “잦은 음주로 노폐물이 두 달여 계속 쌓였기 때문인 것 같다.”고 변명하고는 서둘러 욕실로 향했다.
땀도 땀 나름이다. 냄새가 다르다. 어릴 적 일을 마치신 어머니 등에 업혀 맡은 땀냄새는 향긋했다. 주중에 절제한 뒤 주말등산 때 흘린 땀은 냄새가 거의 안 난다. 술을 마시고 주말에 흘린 땀냄새는 역겹다. 무절제한 생활을 거듭한 뒤 장거리산행 때 난 땀은 체내의 노폐물이 많이 나와 지독하다. 노폐물을 쌓이게 하는 술마시기를 자제해야겠다. 땀의 경고가 무섭다.
이춘규 논설위원 taein@seoul.co.kr
2010-07-14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