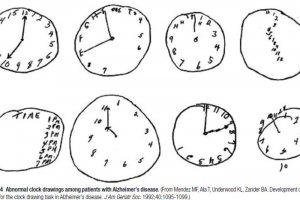TV를 틀면 온통 수다다. 집단으로 떠든다. 수명 또는 수십명이 등장한다. 요즘 오락프로의 대세다. 처음엔 생소했다. 시끄럽게만 들렸다. 마냥 채널을 돌린다. 리모컨을 열심히 돌리는 ‘컨돌이’였다. 그러다가 잠시 멈추면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재미있다. 소개하는 경험담들이. 지어낸 얘기들이 아닐까. 하지만 그뿐이다. 의심보다는 내용에 빠져든다. 언제부턴가 수다에 익숙해졌다.
경상도 출신 탓일까. 세 마디만 한다는 그 경상도. 다변(多辯)을 경박함으로 알고 자랐다. 침묵을 금()으로만 여겼다. 사내의 무거움으로 표현되는 줄 알았다. 나이가 늘어 말수가 늘었다. 다변까지는 아니지만. 딸아이는 여성 호르몬 때문이라고 놀린다. 어쨌든 가족과의 대화는 늘었다. 소통이라면 다행이다.
침묵도 표현이다. 그 자체가 의사 전달이 된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제3자가 읽기는 쉽지 않다. 멀리 있어도 알기 어렵다. 소통이 필요한 시대다. 대화가 소통을 늘린다. 이때의 침묵은 은(銀)이 아닐까.
박대출 논설위원 dcpark@seoul.co.kr
경상도 출신 탓일까. 세 마디만 한다는 그 경상도. 다변(多辯)을 경박함으로 알고 자랐다. 침묵을 금()으로만 여겼다. 사내의 무거움으로 표현되는 줄 알았다. 나이가 늘어 말수가 늘었다. 다변까지는 아니지만. 딸아이는 여성 호르몬 때문이라고 놀린다. 어쨌든 가족과의 대화는 늘었다. 소통이라면 다행이다.
침묵도 표현이다. 그 자체가 의사 전달이 된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제3자가 읽기는 쉽지 않다. 멀리 있어도 알기 어렵다. 소통이 필요한 시대다. 대화가 소통을 늘린다. 이때의 침묵은 은(銀)이 아닐까.
박대출 논설위원 dcpark@seoul.co.kr
2011-03-1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