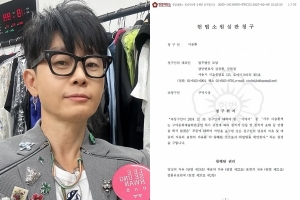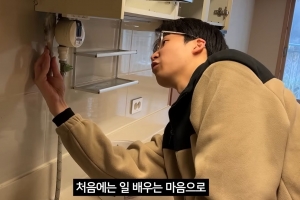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치하에서 은거하던 안네 프랑크에게 희망을 주어 유명세를 떨친 ‘안네 프랑크 밤나무’가 지난해 여름 폭풍에 부러진 이후 ‘증오의 나무’로 변질됐다.
이 나무의 보존책임을 맡은 재단과 보조철골 제작업자 간에 책임 공방이 오가면서 사후처리가 엉망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한때 희망의 상징이던 안네 프랑크 밤나무가 지금은 이를 둘러싼 사람들간 분쟁이 심해지면서 안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9일 보도했다.
수령 150년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 이 밤나무는 이미 몇년 전부터 뿌리 부분에 곰팡이가 슬어 쓰러질 경우 주변 건물을 덮칠 것으로 우려됐다.
이 때문에 시 당국은 나무를 베어내려 했지만 이웃주민들과 식물학자들의 반대에 따라 보존하기로 방향이 정해졌다.
안네 프랑크 밤나무 지원을 위한 재단(SAFTF)의 책임 아래 보조철골을 만들어 나무를 보호하기로 한 것.
재단이사인 헬가 파시빈더는 “이 나무는 희망을 상징하는 기념물”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보조철골이 이 나무의 버팀목 역할을 하게되면 적어도 5년에서 15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저명한 네덜란드 경제학자로 이 재단 이사인 아널드 히르체씨는 지역의 철골구조물 제작업자인 롭 반 더 레지씨를 찾아 계약을 하고 철골 제작을 맡겼다.
17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 철골구조물은 2008년 양측의 동의 아래 완성됐고 제작업자인 반 더 레지씨와 그 하청업체는 비용 가운데 12만 달러를 기부했다.
또 남은 비용 5만 달러 중 재단이 절반 가량 밖에 내지 못할 형편이 되자 제작업자는 잔액을 무이자로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줬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1m나 되는 이 나무가 부러지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긴급 이사회가 열려 대책을 논의했지만 의견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
파시빈더 이사는 철골 제작업체인 반 더 레지씨를 비난했다. 나무가 부러진 즉시 자신의 책임을 알고 증거를 신속히 없애길 원했다는 것이다.
나무의 보험을 담당한 네덜란드의 제네랄리 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철골 구조물의 결함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
반 더 레지씨는 나무가 부러지자마자 보험사 측에 연락했지만 이런 경우 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고 더욱이 부러진 나무를 치우는 것은 보험사에서 비용부담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결국 반 더 레지씨는 이사진에 비용을 나누어 내자고 제안한 채 30t이나 되는 나무의 잔해를 치웠지만 지금은 누구도 이를 치우라는 명령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재단 측과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채 분쟁을 벌이고 있다.
재단 측은 이 업자가 부러진 나뭇조각을 유대인 박물관 등에 보내 보존토록 하자는 재단의 입장을 무시한 채 썩도록 내버려두었다며 비난하고 반 더 레지씨는 이사들이 대책회의에서 나무를 치우자고 동의해 놓고 뒤에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반 더 레지씨는 “나무가 부러지면서 그들에게 갖고 있던 신뢰도 무너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나무의 보존책임을 맡은 재단과 보조철골 제작업자 간에 책임 공방이 오가면서 사후처리가 엉망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한때 희망의 상징이던 안네 프랑크 밤나무가 지금은 이를 둘러싼 사람들간 분쟁이 심해지면서 안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9일 보도했다.
수령 150년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 이 밤나무는 이미 몇년 전부터 뿌리 부분에 곰팡이가 슬어 쓰러질 경우 주변 건물을 덮칠 것으로 우려됐다.
이 때문에 시 당국은 나무를 베어내려 했지만 이웃주민들과 식물학자들의 반대에 따라 보존하기로 방향이 정해졌다.
안네 프랑크 밤나무 지원을 위한 재단(SAFTF)의 책임 아래 보조철골을 만들어 나무를 보호하기로 한 것.
재단이사인 헬가 파시빈더는 “이 나무는 희망을 상징하는 기념물”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보조철골이 이 나무의 버팀목 역할을 하게되면 적어도 5년에서 15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저명한 네덜란드 경제학자로 이 재단 이사인 아널드 히르체씨는 지역의 철골구조물 제작업자인 롭 반 더 레지씨를 찾아 계약을 하고 철골 제작을 맡겼다.
17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 철골구조물은 2008년 양측의 동의 아래 완성됐고 제작업자인 반 더 레지씨와 그 하청업체는 비용 가운데 12만 달러를 기부했다.
또 남은 비용 5만 달러 중 재단이 절반 가량 밖에 내지 못할 형편이 되자 제작업자는 잔액을 무이자로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줬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1m나 되는 이 나무가 부러지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긴급 이사회가 열려 대책을 논의했지만 의견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
파시빈더 이사는 철골 제작업체인 반 더 레지씨를 비난했다. 나무가 부러진 즉시 자신의 책임을 알고 증거를 신속히 없애길 원했다는 것이다.
나무의 보험을 담당한 네덜란드의 제네랄리 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철골 구조물의 결함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
반 더 레지씨는 나무가 부러지자마자 보험사 측에 연락했지만 이런 경우 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고 더욱이 부러진 나무를 치우는 것은 보험사에서 비용부담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결국 반 더 레지씨는 이사진에 비용을 나누어 내자고 제안한 채 30t이나 되는 나무의 잔해를 치웠지만 지금은 누구도 이를 치우라는 명령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재단 측과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채 분쟁을 벌이고 있다.
재단 측은 이 업자가 부러진 나뭇조각을 유대인 박물관 등에 보내 보존토록 하자는 재단의 입장을 무시한 채 썩도록 내버려두었다며 비난하고 반 더 레지씨는 이사들이 대책회의에서 나무를 치우자고 동의해 놓고 뒤에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반 더 레지씨는 “나무가 부러지면서 그들에게 갖고 있던 신뢰도 무너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