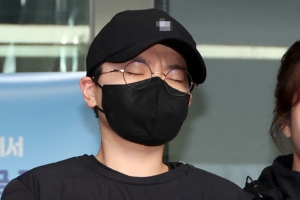북한 평양 접고 몽골 주장하나 트럼프가 반대하는듯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였던 1945년 2월. 소련 흑해연안 휴양지 얄타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모였다. 독일 분할점령을 비롯한 전후처리 원칙을 결정한 이 회담이 스탈린의 요구대로 얄타에서 열렸던 것은 대전의 조기종료를 위해 소련의 참전 등을 끌어내야 했던 미·영의 절박함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었다.이르면 5월 말로 예정된 세기의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5개 장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스위스(제네바), 스웨덴(스톡홀름), 싱가포르, 몽골(울란바토르), 괌이 후보지로 떠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과 미국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싱가포르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북·미 양측이 이처럼 장소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거듭하는 것은 장소 선택이 주는 정치적 함축이 크기 때문이다. 이른바 ‘장소의 정치학’이다. 안방에서 하느냐, 적진으로 뛰어드느냐, 아니면 제3 지대에서 만나느냐에 따라 회담의 성격과 결과는 판이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당초 평양 개최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회담 협상 때도 개최지로 평양을 주장했었다. 이번에도 안방으로 세계 최강국 정상을 불러들여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한껏 부각하고 비핵화 담판을 최대한 유리하게 끌어내겠다는 복안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전 문제는 물론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미국 조야의 반대여론에 이는 일찍이 물 건너간 카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 개최 아이디어는 북한 측이 고사해 아예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고 한다.
남북분단의 상징인 판문점과 서울, 제주도 등 한반도내 장소도 한때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은 ‘제2의 몰타’라는 상징성이 부각되기는 했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지라는 점, 비핵화 해결을 독점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 등 때문에 제외됐다고 한다.
이런 흐름을 거치면서 결국 개최 후보지로 중립지대 성격을 띤 제3국이 자연스럽게 부상했다.
평양에 대사관을 둔 스웨덴과 영세중립국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유학한 스위스 등이 그런 국가들이다. 하지만 유럽국가들은 김 위원장의 소련제 전용기로 논스톱 비행이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이 돼 사실상 멀어졌다는 게 미 언론의 보도다. 북한이 몽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의 우방이라는 점과 숙박·경호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미국 측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YT가 유력 후보지로 싱가포르를 꼽은 것은 이곳이 양측으로서는 안방도 적진도 아닌 제3지 대인 데다 회담 개최를 위한 인프라가 뛰어난 최적지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싱가포르의 거리가 4천700㎞여서 김 위원장 전용기로 논스톱 운항도 가능하다. 북한 대사관이 위치한 점도 김 위원장에게는 유리한 요소다. 비즈니스맨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기 위해서는 화려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게 미 워싱턴 외교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