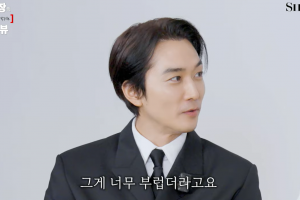국립나주박물관 ‘보이는 소장품 정리실’
분명 박물관 전시실인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유물들은 ‘단장’한 기색이 전혀 없다. 암갈색 토기는 색을 일정하게 입히는 보존 처리 과정이 한창인가 하면, 한쪽에서는 유물 번호를 하나씩 매기고 있다. 뒤편에서는 소장품 하나하나마다 사진을 찍어두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립나주박물관 보이는 수장고
지난 4일 오후 찾은 국립나주박물관의 ‘보이는 소장품 정리실’ 풍경이다. 박중환 국립나주박물관 관장은 “이곳은 소장품이 처음 들어오면 세척, 보존 처리, 기록, 사진 촬영 등 문화재의 주민등록과 같은 등록 작업을 하는 곳으로 이전에는 박물관 내부 직원들만 드나들 수 있는 ‘박물관의 속살’을 관람객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리실 옆에는 흰 천으로 감싼 옹관이 드문드문 눈에 띄는 옹관 수장고와 금속유물, 토기류 등이 격납된 특수 수장고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역시 유리창 안으로 소장품이 어떻게 보관돼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 2013년 11월 개관과 함께 국공립박물관 가운데 국립나주박물관이 처음 국내에서 선보인 ‘보이는 수장고’다.
‘보이는 소장품 정리실’에서 관람객의 질문에 일일이 응답하던 이혜진 보존처리 연구원은 “처음 시작할 땐 관람객들이 적극적으로 물어볼까 반신반의했는데 의외로 질문이 끊임없이 나온다”며 “그간의 전시가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었다면 이런 활동은 박물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드문 기회라 부담은 되지만 자부심도 느낀다”고 했다.
당초 ‘보이는 소장품 정리실’은 개관 직후 오전·오후 제한된 시간에만 일반에게 공개됐다. 하지만 관람객들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2014년 상시 개방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2월에는 큐레이터, 연구원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인터폰까지 놓이면서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노희숙 국립나주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시간제한을 뒀을 때 못 보고 가는 관람객들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고 상시 개방, 인터폰 설치 등 점점 적극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다른 기관에서 안 해본 시도라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우려도 많았지만 ‘박물관이 소장품을 어떻게 다루는지 직접 엿보니 흥미롭다’는 호평이 많아 또 다른 실험도 모색 중”이라고 했다.
나주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7-05-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결혼 안 해도 가족” 정우성 아들처럼…혼외자 1만명 시대 [김유민의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1/25/SSC_20241125094249_N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