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준 장편 ‘오렌지 리퍼블릭’
1993년 개봉한 영화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는 자본주의적 욕망과 문화적인 욕구가 공존하던 1990년대 서울 강남의 모습을 신랄하게 풀어내 관심을 모았다. 소설가 노희준의 장편 소설 ‘오렌지 리퍼블릭’(자음과모음 펴냄)은 자본주의 소비 문화를 대표하는 압구정동 ‘오렌지족’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약 20년 전 등장한 오렌지족은 강남 부유층 2세, 즉 명품 옷에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쾌락을 즐기는 부류로 인식됐다. 압구정동은 그들의 본거지로 꼽혔다. 소설 무대인 강남 출신의 작가는 구체적인 묘사와 재구성으로 ‘오렌지 공화국’을 눈앞에 생생히 재현한다.
그 시절 강남 아이들은 ‘세 종자’로 분류된다. 먼저 배밭 시절부터 살던 원주민과 집값이 싸던 개발 초기에 이주한 재래종 ‘감귤’. 이들은 운이 좋되, 진정한 부자라고는 할 수 없다. 신흥 귀족은 1980년대 유입된 ‘외래종’으로, 이들 중에서도 최상위계층이 ‘오렌지’로 불린다. 뒤늦게 강남에 발을 붙인 이들은 ‘탱자’로 강남에 살지만 ‘온몸으로 강북인 아이들’로 묘사된다.
주인공 노준우는 평범한 회계사의 아들로 핵심그룹에 들지 못하는 ‘왕따’였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그는 우여곡절 끝에 오렌지족 무리와 어울리며 우월감을 맛보지만, 마음 한편은 늘 허하고 우울함이 가시지 않는다. 준우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나는 감귤일 뿐, 그들처럼 상등품 오렌지가 될 수 없었다.”고 스스로 되뇌인다.
소설은 노준우가 ‘오렌지 공화국’에 입성하기까지의 고군분투, 오렌지족 행세를 하며 세상을 깔보고 욕망을 분출하던 시절, 헛된 망상을 버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며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저자는 부(富)라는 국경으로 자신들만의 국가를 건설했던 1990년대 압구정동 오렌지족의 내밀한 풍경을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등장 인물들의 위험한 욕망과 권력에 대한 끝없는 탐욕은 여전히 ‘오렌지 공화국’을 꿈꾸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10-10-30 1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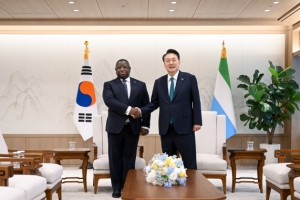










![전쟁·기후변화… 공멸해 가는 인류 깨우다[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