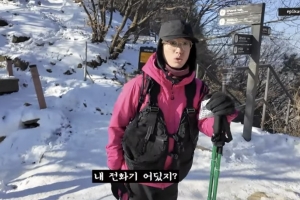【예, 3천년 동양을 지배하다】 박종천 지음 글항아리 펴냄
예로부터 이 땅이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린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중국이 우리를 상대적으로 낮추어 부르는 폄하와 무시의 개념이고 또 하나는 수준 높은 윤리 예의의 높임이자 존중이다. 요즘이야 이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지만 한 사회를 지탱하는 관계와 질서의 높임으로 빛이 난다면 굳이 외면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예(禮). 사전적 정의를 볼 때 이 말은 사회의 질서를 위해 만들어진 유교적 윤리규범을 겨눈다. 본래 고대 사회에서 복을 염두에 두고 신과 절대자를 섬겼던 일에 기원을 둔다지만 그 개념은 다양하게 외연을 넓혀 가며 사회와 조직의 관계를 에두르는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그렇다면 동양의 사상과 세계를 3000년간 지배했다는 이 예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박종천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이 낸 ‘예, 3천년 동양을 지배하다’(글항아리 펴냄)는 자칫 구시대의 것으로 치부될 수 있는 예를 촘촘히 따져 눈길을 끈다.
앞서 말한 대로 기복적 개념의 제사에서 출발해 사회·국가적 조직의 규범 틀이며 개인 관계를 규정짓고 교육으로까지 편입된 예의 점검이다.
저자가 정의한 예의 역사는 책의 부제에서 드러나듯 ‘질서와 억압 사이에 존재하는 삶의 궤적’이다. 적어도 저자의 관점이라면 근본에 보답하는 의례에서 출발한 예의 순기능은 사람끼리의 좋은 관계와 조직·공동체의 원활한 유지며 운영이다. 반면에 규범과 윤리의 틀에 사람과 조직을 가두는 억압은 그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저자가 책에서 일관되게 천착한 예는 역시 순기능과 역기능이 혼합된 기제이다. ‘시(詩)에서 감흥이 일어 예(禮)에서 자립하며 악(樂)에서 완성한다’는 논어의 태백편을 인용한 것도 그런 혼합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를 둘러싼 대립은 오랜 논쟁의 역사를 갖는다. 예를 들어 노자가 예를 상실과 퇴화의 산물로 봤다면 장자는 ‘도를 잃은 뒤에 덕이 있고 덕을 잃은 뒤에 인이 있으며 인을 잃은 뒤에 의가 있고 의를 잃은 뒤에 예가 있다.’며 예를 도의 꽃이요 혼란의 근원이라 여겼다. 그런가 하면 루쉰은 ‘광인일기’를 통해 “예교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비판을 남겼고 순자는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고 했다.
결국 저자는 예에 얽힌 숱한 논쟁을 소개한 끝에 이렇게 매듭짓는다. “우리가 예의 근원을 알고, 그것을 추구한 인간의 사유의 역사를 안다면, 그것이 왜 소통과 억압의 양극단을 왕래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예를 움직이는 주체의 문제이며 동시에 그것을 조절하는 정도의 문제이다. 1만 3500원.
김성호 편집위원 kimus@seoul.co.kr
2011-12-2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