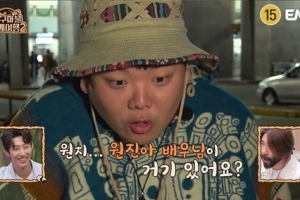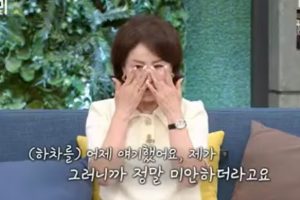모과꽃 피고 지고 500년… 세월의 香만 남았더라
부질없는 짓이겠지만, 십 년 전 나무 아래에서 만난 시골 노파들의 수다스러운 음성을 찾아 나섰다. 누구라도 고향으로 떠나는 때여서다. 작고 아담한 마을이었다. 나무는 마을 뒤 민틋한 동산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미로처럼 이어진 골목길을 몇 차례나 헛짚으며 찾아갔다. 뉘엿뉘엿 지는 저녁 햇살을 받으며 마을 노파들이 나무 곁에서 맥없는 수다를 늘어놓는 중이었다. 세 명의 노파는 서로의 이야기에 아랑곳 않고 끊임없이 제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허공에 흩어지는 말 속에는 고향에 돌아올 자식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히 담겨 있었다. 그때도 명절을 며칠 앞둔 날이었다. 어느 시골이나 기다림이 피어나는 때였다. 내일모레가 추석이다.

500년 넘는 세월 동안 아늑한 마을을 품어 안고 있던 청원 연제리 모과나무. 이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새 생명으로 탈바꿈하는 중이다.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중심을 지켜
오송생명과학단지가 들어선 충북 청원군 연제리의 사라진 옛 풍경이 그랬다. 나즈막한 마을 살림집들을 얼기설기 엮어 낸 비좁은 골목길을 돌아들면 무척이나 커 보이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올 1월에 천연기념물 제522호로 지정된 모과나무다.
오송단지가 착공되기 전에 이 오래된 마을은 ‘모과울’이라고 불린 유서 깊은 전통 마을이었다. 커다란 모과나무가 서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마을의 살림집은 모두 얕은 지붕, 낮은 울타리여서 그때의 모과나무는 실제보다 더 커 보였다. 나무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이건만 주변 환경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실핏줄처럼 얽히고설킨 골목에 다닥다닥 이어진 살림집들을 모두 헐어 내고 너른 터가 닦였다. 아담한 살림집 대신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고, ‘첨단’이라는 수식어를 앞세운 과학단지의 거대한 빌딩이 하나둘 들어섰다.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는 건 그래서다. 옛날 그때의 듬직한 멋은 불과 5, 6년 사이 가뭇없이 사라졌다.
죄다 헐어 내면서도 나무 주위를 공원으로 조성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모과나무를 중심으로 주변에 새로 잘 생긴 조경수를 심고 ‘모과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곳곳에 들어선 빌딩에는 아직 사람들이 채 들어오지 않았고, 몇몇 건물은 여전히 공사 중이다.
공원을 찾는 이가 없는 건 당연한 일이다. 모과나무의 넓게 펼친 가지 위에서 오수를 즐기던 왕거미 한 마리만 땅바닥까지 넓디넓은 거미줄을 내려뜨리고 한가로이 먹잇감을 기다리는 중이다.


세월의 연륜이 배어 있는 연제리 모과나무 줄기.
●모과나무 첫 천연기념물 지정
연제리 모과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모과나무 중 하나다. 모과나무 중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첫 번째 나무이기도 하다. 그만큼 의미 있는 나무다.
연제리 모과나무는 키가 12m쯤 되고, 가슴 높이 둘레는 3m를 넘는다. 소나무나 느티나무, 은행나무에 비하면 작은 규모지만 모과나무로서는 크다. 500살은 넘긴 것으로 짐작되는 이 나무는 나이로서도 단연 최고다.
이 나무 곁에는 조선 세조 초에 유윤이라는 선비가 살았다.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의 오래된 나무 가운데에는 선비 유윤이 심은 노거수가 또 있다. 어린 시절을 충남 서산에서 보낸 유윤은 글공부하던 서당 앞마당에 향나무 한 쌍을 심었는데 그 나무가 아직 남아 있다. 서산 인지면 애정리 송곡서원의 향나무가 바로 그것이다.
젊은 시절부터 벼슬살이를 한 유윤은 단종이 폐위되자 모든 벼슬을 버리고 바로 이곳 모과울에서 은거 생활을 했다. 그가 왜 고향 서산이 아닌 청원 땅을 찾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선비 유윤이 세조에게 그림으로 알려


세조는 학식과 덕이 깊은 그를 조정으로 다시 불러내려 했다. 그러나 유윤은 자신을 찾아온 조정 관리에게 뒷동산의 모과나무 그림을 그려 주며 돌려보냈다. 그림 편지에는 자신이 ‘이 모과나무처럼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모과나무를 쓸모없는 나무라고 표현한 건 모과 열매의 쓰임새가 적기 때문이다. 여름이 지나 제법 탐스럽게 익는 열매는 보기도 좋고 향기도 좋지만 먹을 수는 없다. 나무 열매의 별다른 쓰임새를 찾아내지 못했기에 옛 사람들은 모과나무를 쓸모없는 나무로 여겼다.
유윤의 서한을 받은 세조는 모과나무를 뜻하는 ‘무’(楙)와 마을 동(洞)을 써서 유윤에게 ‘모과나무 마을에 사는 처사’라는 뜻의 ‘무동처사’(楙洞處士)라는 이름을 지어 보냈다고 한다. 이때가 1450년이었다. 그때에도 이 모과나무는 제법 큰 나무였다고 하니 지금 연제리 모과나무의 나이는 500살을 넘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스스로 상처 치유하며 살아온 500년
바람 따라 세월 따라 나무는 적잖이 상처도 입었다. 상처가 깊어지면 스스로 상처를 감싸 안으며 몸을 부풀리기도 했다.
치유의 흔적으로 남은 울퉁불퉁한 옹이는 뿌리 부근에서부터 침묵 속의 용트림으로 피어올랐다. 단단하면서도 매끈매끈한 줄기 표면에는 모과나무 특유의 얼룩 무늬도 선연하다. 나무의 연륜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나무 그늘에 들어서서 아직은 따가운 한낮의 햇살을 피하며 사라진 옛 마을, 옛 사람들을 떠올렸다. 나무 곁으로 난 텃밭 둑길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끊임없이 늘어놓던 노파들의 왁자한 수다가 그리웠다. 시골 집 뒷동산을 잃고 떠난 그때 그 노인들은 지금 어느 낯선 아파트 빌딩 숲 사이에서 예전의 수다를 잃었을지도 모른다. 여전히 도시의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을 노인들의 안부가 궁금하다.
오후의 태양이 서쪽으로 떨어지면서 나무 그늘 안쪽으로 햇살을 밀어넣을 때까지 공원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추석이 내일모레인데 기다리는 사람도, 찾아올 사람도 모두 사라진 시골 마을의 추억이 그렇게 흩어졌다.
글 사진 청원 고규홍 나무칼럼니스트 gohkh@solsup.com
2011-09-08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