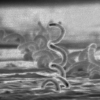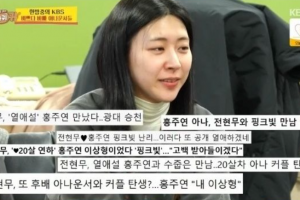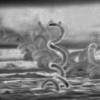생명의 신비가 지어내는 살아 춤추는 그늘
선선한 바람, 서늘한 그늘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농부들은 한층 바빠지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찌는 더위와 타는 태양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작물에 전달되어, 왕성한 생명활동을 이루는 계절이니까요. 농촌의 분주함은 아낙이라고 피해가진 않습니다. 집에 혼자 둘 수 없는 아기도 어미의 등에 업혀 밭으로 따라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땀이 흥건히 배어나오는 어미의 등에 엎드려선 낮잠에 들 수 없습니다. 내내 칭얼거리며 어미의 일을 훼방 놓지요. 이때 요긴한 곳이 바로 농촌 들녘 어디에서라도 만날 수 있는 나무 그늘입니다.

잘 자란 느티나무 한 그루에는 무려 5백만 개의 잎사귀가 돋아납니다.
느티나무 그늘은 5백만 개의 이파리가 모여서 이뤄내는 특별한 곳이지요. 한 장 한 장의 잎사귀가 드리운 그림자는 매양 똑같겠지만, 나무 전체가 지어내는 그늘의 각 부분은 제각기 다릅니다. 나무 가운데 자리에 드리운 짙은 그늘은 까맣다고 이야기할 만큼 어둡지요. 여러 장의 잎이 서로 겹친 데다 굵게 발달한 나뭇가지도 얽히고설켜 지어낸 깊은 그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뭇가지 가장자리로 한 발 내디디면 그늘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나무의 생김새에 따라 한 발 차이로 그늘이 더 깊어질 수도 옅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늘이 지어내는 깊이의 차이를 가장 뚜렷이 느낄 수 있는 건 나뭇가지 가장자리에 이르렀을 때일 겁니다. 겨우 가지 끝에서 하늘거리는 나뭇잎 한두 장이 살그머니 지어낸 옅은 그림자입니다. 빛이라 해야 할지, 그림자라 해야 할지 헷갈리는 야릇한 그늘입니다.


일본의 소설가 ‘다니자키 준이치로’는 <음예예찬>이라는 산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가 예찬한 ‘음예’는 단순한 그늘이 아닙니다. 빛과 그림자를 둘로 나누는 이분법으로는 그의 음예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림자이면서도 그림자가 아니고, 어둠이면서도 어둠이 아닌 빛과 그림자 사이의 폭넓은 경계가 음예입니다. 그는 일본의 다다미방에서 한지로 된 창으로 스며드는 어슴푸레한 빛을 놓고 그늘, 혹은 음예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했지만, 느티나무 그늘이야말로 다다미방 못지않은 음예의 공간이지 싶습니다.


게다가 느티나무 그늘은 살아 움직입니다. 5백만 개의 나뭇잎들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며 살짝 겹쳐져 조금 짙은 그늘을 지었다가, 이내 흩어지며 옅은 그림자를 지어냅니다. 살아 있는 생명이 지어내는 그림자라는 이유에서 느티나무 그늘에는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생명의 싱그러움이 있습니다. 그늘인 듯하지만, 빛 환한 곳이고, 햇살 환히 비쳐드는 곳이지만, 그늘인 곳이지요. 밝은 그늘, 혹은 어두운 빛이라고 해야 할 듯합니다.


모기가 들지 않는다는 것도 아기를 느티나무 그늘에서 재워야 하는 까닭입니다. 느티나무 그늘에는 모기뿐 아니라 해충이 들지 않습니다. 모기와 같은 해충이 살기 위해서는 온도가 높고 공기도 축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느티나무 그늘은 온도가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사방으로 바람이 시원스레 드나들어 축축하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작동하고, 강제로 공기를 정화시키는 도시의 꽉 막힌 실내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삽상함(바람이 시원하게 불어 상쾌함)이 살아 있는 그늘이지요.


느티나무뿐이 아니지요. 적당히 큰 나무들이라면 모두 그늘을 드리우고 그 안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그늘 아래에서 평범한 사람살이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일테면 잎이 가늘어 그늘을 짓기에 맞춤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십상인 소나무도 사람을 불러 모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살이에 긴한 그늘로는 느티나무 못지않습니다. 특히 비를 피하는 데는 소나무만한 나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잎이 어른 손바닥보다 넓은 오동나무 쯤 되어야 비를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넓은 잎에는 빗물이 그대로 미끄러져 내리거나 혹은 넓은 잎 가운데에 모였다가 굵은 줄기가 되어 한꺼번에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촘촘히 난 바늘잎 사이에 빗물을 오래 머금는 소나무가 비를 피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중국에서 전해오는 소나무에 관한 전설 역시 소나무의 특징에 기댄 것입니다. 진시황 때의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여름 날 들녘 나들이에 나섰다가 소나기를 맞게 됐지요. 피할 곳을 찾지 못한 임금과 신하들이 당황하던 차에 곁에 있던 한 그루의 소나무가 임금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가만히 가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임금은 나무 안에 들어서서 소낙비를 피했지요. 임금, 진시황은 곧바로 이 기특한 나무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소나무를 ‘벼슬 나무’라 불렀고, 한자로는 나무 木자 옆에 벼슬 公자를 쓴 송(松)자를 쓰게 됐습니다.
비를 피하건 볕을 피하건 사람살이에 더없이 요긴한 가림막이가 나무 그늘입니다. 그냥 나무 그늘이라고 하지만,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무수한 생명이 빚어내는 빛과 그림자의 찬란한 축제입니다. 돌아보면 농경문화권에서 삶을 이어온 우리 민족은 나무 그늘에서 거의 모든 사람살이를 이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해와 비를 피했을 뿐 아니라, 마을 살림을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도 나무 그늘에 모였습니다. 또 청춘 남녀가 오순도순 사랑을 속삭인 곳도, 이별의 아픈 상처를 새긴 곳도 바로 나무 그늘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이나 글로 새겨두지 않았어도 우리는 나무를 귀중하게 여겨왔지요. 어떤 나무는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목, 혹은 당산나무가 됐고, 또 어떤 나무는 편안한 쉼터인 정자나무가 되어 오랫동안 우리 곁에 살아 남았습니다.
가만히 눈 들어 돌아보면 우리 사는 곳 어디에도 나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도심이어도 그렇지요. 가로수는 물론이고, 고층 아파트 곁에도 나무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곁의 나무 그늘에 들어서야 할 차례입니다. 가만히 생명의 양식을 지으며 나무가 뿜어내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나의 숨을 나무에게 전해주는 생명의 순환 이치를 깨닫는 일, 그것이 곧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답게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글·사진_ 고규홍 나무해설가 www.solsup.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