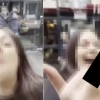서울대 이경은씨 박사 논문 “입양관련 국제협약 의도적·정교히 회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선진국’에 속하면서도 ‘아동수출국’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아동 권리를 보호하는 법·제도가 다른 선진국보다 뒤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특히 지난 60년간 가장 많은 아동을 다른 나라로 입양시켰으면서도 입양 관련 국제협약 이행을 ‘의도적이고 정교하게’ 피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12일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 이경은씨의 박사학위 논문 ‘국제입양에 있어 아동 권리의 국제법적 보호’를 보면 제3세계 취약가정 아동이 국제입양기관의 중개로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 가정에 보내지는 현재의 국제입양 형태 조성의 원인이 된 나라로 한국이 꼽힌다.
논문은 ‘국제입양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외국학자의 표현을 인용하며 “한국 아동은 서구 주요 수령국에서 국제입양의 대명사와 같다”고 설명한다.
실제 1950년대 이후 국제입양된 한국 아동은 전체 국제입양 아동(50만명)의 3분의 1이 넘는 20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 공식통계로도 국제입양 한국 아동은 재작년까지 16만6천여명에 달한다.
제3세계 아동이 선진국에 대규모로 입양되는 형태의 국제입양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나타나기 시작해 1970∼1980년대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선진국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피임·불임 등이 늘면서 입양수요가 늘었지만 ‘입양할만한 아동’을 자국에서 찾기는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아동보호체계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고아 등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등 제3세계 나라들은 도시화가 이뤄지며 가족의 기능이 약화하고 미혼모와 편모가정의 실업·빈곤문제로 국제입양 시장에 ‘공급’할 아동이 늘었다.
논문은 이런 상황에 더해 홀트아동복지회 등 국제입양 전문기관이 자리를 잡고서 제3세계 고아를 선진국에 입양 보내는 것이 사회적·재정적 부담이 덜하면서도 아동복지를 향상하는 판단을 내리고 국제입양을 쉽게 하는 법·제도를 구축한 점도 입양 증가에 기름을 부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1961년 제정한 고아입양특례법은 국제입양이 쉽게 이뤄지도록 하고자 만든 대표적인 법이라고 논문은 지적했다. 당시 미국의 이민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이 법은 한국 아동을 입양하려는 외국인에게 각종 특례를 부여했다.
문제는 경제·사회발전에 성공한 한국이 고아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국제입양으로 간단히 ‘해결’하려는 정책과 법·제도를 여전히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런 탓에 한국은 지난 60년간 아동송출을 지속하는 ‘최장기간 송출국’이자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송출국으로 남았다. 논문은 “한국은 국제사회가 국제입양에 대해 고민한 결과를 집대성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조차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이 UN 아동권리협약 등의 입양 관련 조항도 이행을 유보하거나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등 회피하고 있다고 논문은 비판했다.
특히 한국이 거부·유보한 협약 대부분이 1970∼1980년대 한국 아동을 중심으로 국제입양이 과도하게 늘면서 국제사회가 마련한 것이라고 논문은 설명했다.
논문은 한국이 이러한 국제협약을 거부하는 이유로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협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헤이그협약은 어떤 아동을 입양 보내도 괜찮은지 ‘입양 적격’ 판단을 법원 등 공적 기관이 하도록 규정하지만, 한국은 이런 판단을 사적 기관인 전문입양기관에 떠넘긴 상황이다.
즉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어떤 아동이 입양대상에 해당하는지 공적 기관의 판단이 필요 없고 사적 입양기관에 아동을 맡기고 입양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구조가 아직 유지된다는 것이다.
논문을 작성한 이경은씨는 “미혼모와 그들이 낳은 아동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것만으로 한국이 아직 입양아동 송출국에 머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서 “아동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보호와 복지를 수십 년간 사적 기관에 의지하고 국제입양으로 해결한 경험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역량을 약화시켰다”라면서 “문제는 한국에서 시작된 왜곡된 입양법제가 중국 등 다른 국가로 퍼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