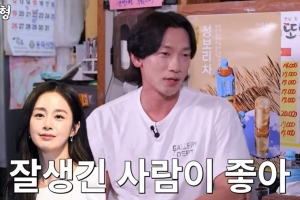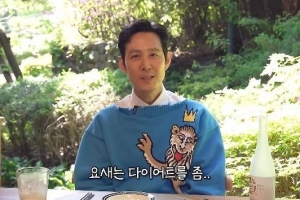1942년 포로 감시원 공고에 속아 징집
종전 뒤 사형 판결… 감형돼 도쿄서 복역
韓피해자 모임 ‘동진회’ 이끌며 보상 요구
日, 국적 상실 이유로 보상도 사과도 안 해
한국 정부는 2006년 강제동원 피해 인정

연합뉴스

이학래 동진회 회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남 출신인 이학래옹은 17살이던 1942년 돈을 많이 벌게 해 준다는 일제의 포로 감시원 모집 공고에 속아 징집됐다. 태국과 미얀마를 잇는 다이멘 철도 부설 현장의 포로 감시원이던 그는 종전 후 싱가포르에서 연합군이 연 전범재판에서 연합군 포로를 학대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태평양전쟁 관련 A급 전범에는 침략전쟁을 기획·시작·수행한 지휘부, B·C급 전범엔 상급자 명령 등에 따라 고문과 살인 등을 행한 사람들이 해당한다. 포로 감시원은 이들보다 위치가 낮았지만 연합군 포로와 직접 접촉했다는 이유로 B·C급 전범이 되는 일이 많았다. 이옹과 같은 한반도 출신 조선인 중 148명이 일제 전범으로 분류됐고 23명이 사형당했다. 고인은 사형 판결을 받긴 했지만 감형돼 도쿄 스가모형무소에서 11년을 복역했다.
이옹은 일본 국적자에 준한다는 판단으로 전범 처벌을 받았음에도 일본 정부의 전후 보상 대상에선 제외됐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로 인해 한반도 출신인 이옹은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인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모아 택시 회사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 가는 한편 동진회를 만들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999년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일본 정치권에 한국인 전범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입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그는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전범으로 분류된 일본인에게는 보상 연금 등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보상이나 사과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끝내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이옹에 대한 명예회복은 2006년 늦게나마 한국에서 이뤄졌다. 한국 정부는 그해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한국인 B·C급 전범자를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했다. 일본에 거주했던 이옹에게 비록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조국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1-03-30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