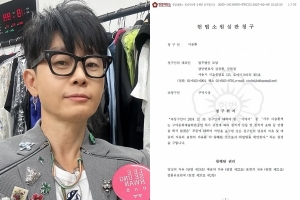2014 AG 메달 터치다운‘선배’ 아빠께 보일거예요
막내는 고달프다. 언니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인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느덧 치다꺼리는 막내 몫이 됐다. 운동장에 나갈 땐 매번 아이스박스 가득히 얼음을 퍼 담고, 무거운 공도 여린 어깨에 짊어진다. 목이 말라도 언니들에게 먼저 물통을 건넨다. 파이팅도 가장 큰 목소리로 외친다. 여자 럭비대표팀의 막내 송소연(18·리라아트고3)이다.

송소연
소연이가 처음 기억하는 럭비는 ‘공포’였다. 소연이가 유치원생 때였다. 그라운드에 선 럭비선수 아빠는 날렵하고 늠름했다. 소연이는 목이 터져라 아빠를 응원했다. 박진감도 잠시. 그라운드를 휘젓던 아빠가 갑자기 나뒹굴었다. 온몸에서 피가 흘렀다. 주변 아저씨들이 “보지 마라.”고 놀란 아이의 눈을 가렸지만 소연이는 빨간 피를 똑똑히 목격했다. 충격이었다. 그래서일까. 럭비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변했다. 아빠가 럭비인들과 있는 자리에 소연이도 함께하면서 언제부턴가 ‘동경’이 생겼다. 럭비의 기본정신 ‘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All for One, One for All)’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럭비인들의 끈끈함과 의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시간이 흐를수록 소연이는 럭비에 ‘호감’이 생겼다.
그리고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 공고가 뜨자마자 지원했다. 결국 가슴에 분홍색 무궁화를 달았다. 소연이는 “처음 합숙에 들어올 때만 해도 단체생활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집보다 더 편하다.”고 깔깔거렸다.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체력훈련 때는 마구 반항심(?)이 샘솟지만, 막상 힘든 걸 하고 나면 개운하고 성취감이 든단다.
소연이의 꿈은 여군 부사관이다. 그중에서도 혹독한 특전사를 지원하고 싶다고 큰소리친다. 하지만 지금은 럭비가 인생의 1순위다. “엄청 빠르게 달려서 트라이를 찍고 싶어요. 일단은 다 제치고 럭비에 올인할래요.” 대학진학에 대한 마음도 접었다. “럭비부가 있는 대학에 가고 싶은데 없잖아요. 대학교는 저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한 달 중 20일을 합숙하는 고된 일정이지만 소연이에게 쉼표는 없다. 비합숙 기간엔 아빠의 모교인 ‘럭비 명문’ 양정고등학교를 찾아 개인교습(?)을 한다.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실망하고 자책하며 구슬땀을 흘린다. 온 가족이 소연이의 도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부담도 되지만 든든하다고.
5월 출항한 대표팀의 목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메달’이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는 정식 종목에 포함됐다. “끝까지 포기 안 하면 저도 거기 있지 않을까요. 꼭 가고 싶어요. 아직 어리니까!” 소연이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1-06-17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