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에서 마음껏 휴식을 취한다 해도 역시 가장 편한 것은 ‘우리집’이다. 스포츠도 마찬가지. 항상 연습하던 내 나라에서, 내 운동장에서 뛴다면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편하다. 열광적인 응원은 덤. 실력의 100% 이상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을 보면 알 수 있다. 안방에서 치른 굵직한 대회마다 걸출한 성적을 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종합 4위,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세계가 깜짝 놀란 결과였다.
그런 면에서 캐나다는 더부살이(?) 신세나 다름없었다. 안방에서 개최한 두 번의 올림픽에서 모두 ‘노골드’ 수모를 당한 것. 1976년 몬트리올 하계올림픽(은5·동6) 때도,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은2·동3) 때도 금메달은 없었다. 때문에 이번에도 ‘노골드 징크스’가 이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나 기우였다. 15일 마침내 34년 묵은 한(恨)이 풀렸다.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에서 알렉산드르 빌로도(22)가 정상에 올랐다. 캐나다는 열광했다. 도서관 못지않게 고요한 메인프레스센터마저 캐나다 기자들의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짜릿함도 있는 메달 소식이라 캐나다는 더 뜨거워졌다. 2006토리노올림픽 우승자인 데일 베그-스미스(호주)를 물리치고 우승해서다. 베그-스미스는 밴쿠버 태생이다. 스키코치와 훈련 시간문제로 갈등을 빚다 16살 때 호주로 귀화했다. 대회 첫 금메달이 조국을 배반(?)하고 호주에 금메달을 안긴 선수를 물리치고 딴 것이다.
그동안 밴쿠버에서 올림픽 분위기를 찾기는 힘들었다. 파란옷을 차려입은 자원봉사자들은 환한 미소를 보냈지만, 시민들은 무덤덤했다. 여름이면 바다로, 겨울엔 스키장으로 떠나는 이들은 “우리는 매일매일이 올림픽이다.”라며 심드렁했다. “관광객이 늘고 복잡해서 싫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얄궂게 추적추적 비까지 내렸다.
하지만 안방에서 딴 첫 ‘골드’ 소식에 올림픽 분위기는 순식간에 후끈 달아올랐다. 젊은이들은 빨간 단풍잎이 그려진 국기를 두르고 거리를 활보한다. 지하철에선 국가 ‘오 캐나다’를 부르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제야 좀 올림픽답다.
zone4@seoul.co.kr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사진 보러가기]
그런 면에서 캐나다는 더부살이(?) 신세나 다름없었다. 안방에서 개최한 두 번의 올림픽에서 모두 ‘노골드’ 수모를 당한 것. 1976년 몬트리올 하계올림픽(은5·동6) 때도,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은2·동3) 때도 금메달은 없었다. 때문에 이번에도 ‘노골드 징크스’가 이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나 기우였다. 15일 마침내 34년 묵은 한(恨)이 풀렸다.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에서 알렉산드르 빌로도(22)가 정상에 올랐다. 캐나다는 열광했다. 도서관 못지않게 고요한 메인프레스센터마저 캐나다 기자들의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짜릿함도 있는 메달 소식이라 캐나다는 더 뜨거워졌다. 2006토리노올림픽 우승자인 데일 베그-스미스(호주)를 물리치고 우승해서다. 베그-스미스는 밴쿠버 태생이다. 스키코치와 훈련 시간문제로 갈등을 빚다 16살 때 호주로 귀화했다. 대회 첫 금메달이 조국을 배반(?)하고 호주에 금메달을 안긴 선수를 물리치고 딴 것이다.
그동안 밴쿠버에서 올림픽 분위기를 찾기는 힘들었다. 파란옷을 차려입은 자원봉사자들은 환한 미소를 보냈지만, 시민들은 무덤덤했다. 여름이면 바다로, 겨울엔 스키장으로 떠나는 이들은 “우리는 매일매일이 올림픽이다.”라며 심드렁했다. “관광객이 늘고 복잡해서 싫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얄궂게 추적추적 비까지 내렸다.
하지만 안방에서 딴 첫 ‘골드’ 소식에 올림픽 분위기는 순식간에 후끈 달아올랐다. 젊은이들은 빨간 단풍잎이 그려진 국기를 두르고 거리를 활보한다. 지하철에선 국가 ‘오 캐나다’를 부르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제야 좀 올림픽답다.
zone4@seoul.co.kr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사진 보러가기]
2010-02-17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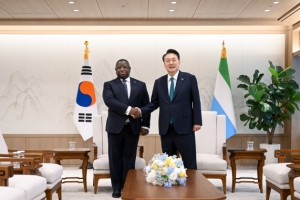










![전쟁·기후변화… 공멸해 가는 인류 깨우다[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