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의 사유
루스 이리가레·마이클 마더 지음/이명호·김지은 옮김
알렙/360쪽/1만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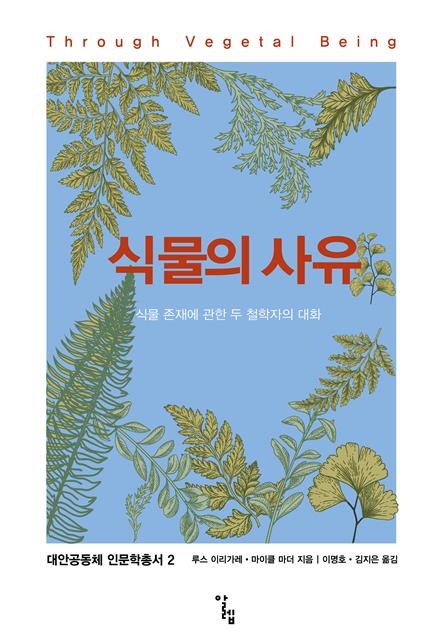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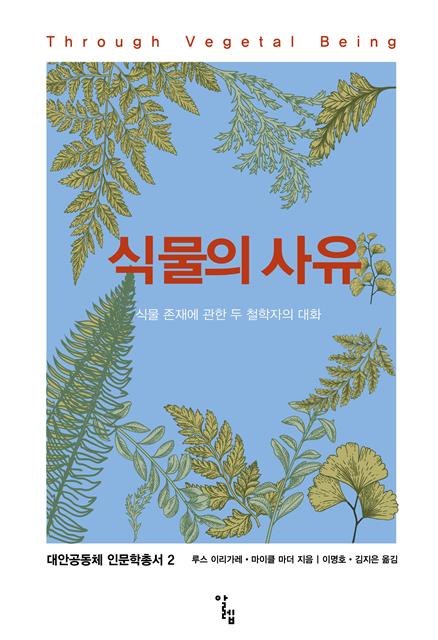
이리가레는 서문에서 “우리가 책을 함께 쓰게 된 것은 자연과 생명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런데 왜 하필 식물이 대안 모색의 핵심으로 간주됐을까. 그동안 인간과 동물에 비해 식물에 대한 사유는 부족했다. 식물은 원자재 정도로 치부됐을 뿐, 인간이 그 일부를 이루는 생명의 토대로 이해되지 못했다. 그러니 식물성과 연대하는 건 곧 생명의 근원에 대한 사유를 길어 올리는 것과 같다는 게 저자들의 생각이다.
저자들의 공통된 관심은 하이데거를 경유해 초기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그리스 철학에서 읽어낸 ‘퓌시스’(phusis·자연)는 죽어 고정된 물체가 아니라 ‘스스로 자라고 변화하는 물질’이다. 이런 속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존재는 ‘퓌톤’(phuton·식물)이다. 저자들은 이동과 변화가 불가능한 존재로 간주됐던 식물에게서 퓌시스를 발견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자들이 말하려는 건 결국 ‘인간 되기’란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적 속성을 문화적으로 키워 내는 것이지, 자연과의 분리나 단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 여겨진다. 다만 식물로부터 자연과 더불어 성장하는 존재 양식과 자세를 배우자는 건데, 이를 설명하는 방식이 이렇게 어려워야 할까 싶다.
손원천 선임기자 angler@seoul.co.kr
2020-08-28 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