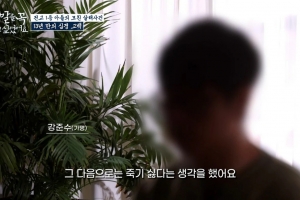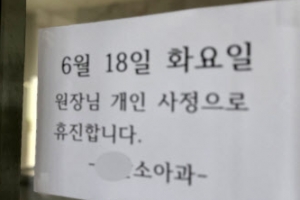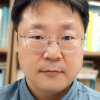“지금 비상이라 길게 통화 못해. 거기(찜질방) 많이 불편할 텐데 노인네(어머니) 잘 부탁해. 아프지 말고….” 사흘 만에 듣는 남편의 반가운 목소리. 휴대전화를 붙잡은 박춘옥(47·연평면 남부리)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애써 울음을 삼킨 박씨가 짐짓 밝은 목소리를 내며 농담인 양 말을 꺼냈다.
●‘사지’에 있는 남편 생각에 애타
“살아만 돌아와. 나중에 보면 당신 좋아하는 우럭 매운탕 끓여 줄게. 나랑 어머니 걱정은 말고.” 피곤한 탓인지 낮게 잠긴 남편의 음성. ‘얼마나 두려울까. 잠은 잘 잘까.’ 그는 혼자 두고 온 남편 생각에 목이 메었다. 연평도 토박이인 박씨는 북한의 해안포 공격 당일 밤 11시 인천으로 빠져나왔다. 여든이 넘은 시어머니 박선비(85)씨와 함께였다. 30년째 해병대 군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편 김모(54)씨는 그대로 섬에 남았다.
피난길 내내 남편과 쌓아 왔던 30여년간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남편은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던 이웃 동네 오빠였다. 두 사람은 1984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나이 차가 있어서인지 유난히 자상하고 착한 남편이었다.
●연락 끊긴 사흘간 꼬박 밤샘
그런 남편만 ‘사지’에 두고 온 것 같아 박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북한의 추가 도발 관련 소식만 들리면 다른 피난민보다 애간장이 더 탔다. 노모는 “죄인 같은 심정”이라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박씨는 김장을 하다 이웃집이 포탄에 맞아 불타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맨발로 뛰쳐나왔다. 부둣가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디야? 안 들려, 안 들려.”라는 말만 들리고 전화가 바로 끊겼다. 그 뒤 남편과의 생이별로 연락이 끊긴 사흘간 그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29일 피난민들이 모여 있는 인천 신흥동 찜질방에서 붉게 충혈된 눈의 박씨를 만났다. 혹시 남편에게 해가 갈까 봐 한사코 남편 이름과 본인 사진 공개를 꺼렸다. 지금 심정을 묻는 기자에게 그가 대답했다.
“몸 건강히, 잘 있을 거예요. 아니 잘 있어야 해요. 꼭….” 백발의 노모가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인천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사지’에 있는 남편 생각에 애타
“살아만 돌아와. 나중에 보면 당신 좋아하는 우럭 매운탕 끓여 줄게. 나랑 어머니 걱정은 말고.” 피곤한 탓인지 낮게 잠긴 남편의 음성. ‘얼마나 두려울까. 잠은 잘 잘까.’ 그는 혼자 두고 온 남편 생각에 목이 메었다. 연평도 토박이인 박씨는 북한의 해안포 공격 당일 밤 11시 인천으로 빠져나왔다. 여든이 넘은 시어머니 박선비(85)씨와 함께였다. 30년째 해병대 군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편 김모(54)씨는 그대로 섬에 남았다.
피난길 내내 남편과 쌓아 왔던 30여년간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남편은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던 이웃 동네 오빠였다. 두 사람은 1984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나이 차가 있어서인지 유난히 자상하고 착한 남편이었다.
●연락 끊긴 사흘간 꼬박 밤샘
그런 남편만 ‘사지’에 두고 온 것 같아 박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북한의 추가 도발 관련 소식만 들리면 다른 피난민보다 애간장이 더 탔다. 노모는 “죄인 같은 심정”이라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박씨는 김장을 하다 이웃집이 포탄에 맞아 불타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맨발로 뛰쳐나왔다. 부둣가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디야? 안 들려, 안 들려.”라는 말만 들리고 전화가 바로 끊겼다. 그 뒤 남편과의 생이별로 연락이 끊긴 사흘간 그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29일 피난민들이 모여 있는 인천 신흥동 찜질방에서 붉게 충혈된 눈의 박씨를 만났다. 혹시 남편에게 해가 갈까 봐 한사코 남편 이름과 본인 사진 공개를 꺼렸다. 지금 심정을 묻는 기자에게 그가 대답했다.
“몸 건강히, 잘 있을 거예요. 아니 잘 있어야 해요. 꼭….” 백발의 노모가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인천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11-30 6면